[칼럼] 나영무 박사의 '말기 암 극복기'(1)
-
1218회 연결
-
0회 연결
본문
치질로 착각한 '죽음의 병'···축구대표팀 주치의 '말기암 극복기'
‘말기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내 삶은 계속돼야 한다.’
3년여에 걸친 암 투병에서 수만번 되뇌었던 말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나를 지탱해 준 원동력이었다.
2018년 8월 신촌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안중배 교수님 진료실.
10여분의 짧지만 무거웠던 시간은 선홍빛 혈변처럼 지금도 선명하다.
그해 나는 배가 불룩한 느낌을 자주 받았고, 변을 보는 게 수월하지 않았다. 그저 치질이 조금 있기에 치질로 생각하고 수술까지 받았었다.
하지만 항문에서 액 같은 것이 분비되는 등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난생처음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중앙포토.
“암(癌)에 걸렸어요. 암세포가 간은 물론 폐까지 전이된 직장암 4기입니다”는 교수님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살이 찐 것도 아니고, 더욱이 술과 육식도 즐기지 않는 편이라 대장암이라는 말에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간의 4분의 3 이상 넓게 퍼져 있는 암세포들의 사진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현실로 다가왔다.
‘암’이라는 단어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 어둠의 터널에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명색이 의사인데 “왜 내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 말기에 이르도록 방치했을까”하는 자책이 먼저 들었다.
또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유명탤런트의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는 말도 떠올랐다.
병원을 나서는데 사랑하는 가족, 나의 진료실을 거쳐 간 수많은 환자의 모습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웠다.
동시에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욕구도 강하게 들었다.
내 몸에 퍼진 암세포를 빨리 제거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우선 말기 암을 있는 그대로 담담히 받아들이자고 다짐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였던 나는 문득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차례로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랐다.
그 당시 암 판정은 일종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첨단 의료기술과 세계 정상급 암 수술 실력을 갖춘 요즘이었다면 부모님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고독한 항암 치료와 함께 차디찬 수술대에 나 자신을 던지기로 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나는 몸속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완전 관해(완전완화) 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아야 들을 수 있는 ‘완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3년 전 나의 생존 확률은 5%에 불과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살아 있다.
또한 나의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매일 만나는 소소한 행복도 누리고 있다. 모든 것에 고마운 마음이다.
중앙일보 연재를 시작하는 것은 전국 215만명에 이르는 암 환자들과 ‘투병의 지혜’를 나누며 따뜻한 동행을 하고 싶어서다.
암을 이겨내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위한 치료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완치’의 길로 가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암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1편을 갈무리하며 두 가지만 당부드린다.
먼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과신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 내 몸 안의 불청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영무 박사는 솔병원 원장으로 재활의학 ‘명의’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축구국가대표팀 주치의를 비롯해 김연아와 박세리 등 수많은 태극전사들의 부상 복귀를 도우며 스포츠재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018년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았던 나 박사는 투병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드리고자 이번에는 ‘암 재활’에 발벗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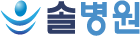

댓글목록 0